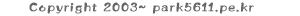5070 게시판 - 지나온 시절에 대한 글, 추억담을 남기는 공간

소설 채만식의 ‘태평천하’엔 “난찌(런치) 먹으러 가자”는 춘심이 따라 옥상 밑 식당에 들른 윤직원 영감이 “촌사람은 못 먹겠다”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태준의 ‘어머니’라는 희곡에선 엘리베이터를 보고 비행기인 양 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일제의 핍박이 극으로 치닫던 1930년 우리나라 1호 백화점인 미쓰코시백화점이 그려진 문학작품이다. 막 근대화의 맛을 보기 시작한 조선인에게 백화점은 그렇게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먼지만큼이나 우리네 삶의 면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백화점의 추억 한편을 따라가 보자.
▶1930~해방전후: 황소 한 마리에 담긴 서글픔
‘1원어치를 사시면 황소 한 마리!’…1936년 모 일간지에 실린 화신연쇄점의 ‘춘기대매출’ 전단 문구이다. 고작 1원어치를 산다고 황소를 경품으로 준다니…. 하지만 가난으로 배를 주려야 했던 당시로선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다.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은 면사무소 서기 월급과 맞먹는 30원이었다. 쌀 석 섬 값이 15원 하던 시절. 그런 황소를 경품으로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채 가라앉지 않은 1950년대는 백화점도 제 기능을 잃었다. 부정 외래품이 백화점 매장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는 혼탁했다. 선물도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다. 계란이나 찹쌀, 고추, 돼지고기 등 수확 농산물을 직접 전달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 호사스런 생활로 여겨지던 당시로선 이 역시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을 고민해야 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백화점에 진열된 국산품을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이 기사화될 정도로 당시 한국은 겨우 공업화의 첫 단추를 꿰고 있었다.
당시 백화점에서 경품으로 인기를 끈 상품은 설탕과 미풍(화학조미료). 지금은 흔하디흔한 물건들이지만 이때만 해도 일부 부유한 집안에서나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상품이었다. 라면 50개입 한 상자, 세탁비누 30개 세트, 석유곤로, 짚으로 엮은 계란 등도 오롯이 백화점 한쪽을 차지했다. ‘그래-뉴설탕’의 당시 가격은 780원(6㎏ 기준), 맥주 1상자와 라면 50개는 각각 2000원, 500원에 팔렸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이다. 하지만 당시 방직공장 여공들의 평균 월급은 고작 3440원이었다. 몇백원 하는 설탕도 몇천원 하는 맥주와 코트도 그때는 사치품일 수밖에 없었다.
62년엔 새나라자동차가 특등 경품으로 내걸렸다. 출고가만 22만4000원에 달했던 새나라자동차는 우리네 부모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70년대 한국사회를 압축하고 있다. 허례허식을 없앤다고 상품권을 퇴출시켰던 시대이기도 하다.
백화점 사은품으로는 이쑤시개, 세숫대야, 타월 등 일상 생활용품이 나왔다. 5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겐 추첨을 통해 쌀 한 트럭을 경품으로 준다는 이색 전단도 등장했다.
3개로 묶어서 싸게 파는 ‘번들세일’도 처음 등장했다. 지금의 ‘1+1’과 같은 개념. 번들세일에 등장한 상품도 넥타이부터 양말, 손수건, 행자목상, 고데빗 등 살림살이와 관련된 품목이 많았다. 골프용 공과 장갑, 양말 등 3개 묶음이 번들세일 상품으로 나와 일부 계층이지만 골프가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73년 ‘신세계가 추천하는 베스트 100’의 선물 목록엔 설탕이 단연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77년 세모(연말)전단에선 ‘길벗’이라는 국내 양주세트가 설탕을 몰아냈다.
70년대 들어선 화장품과 여성용 속옷, 스타킹 등이 상당한 고급 선물세트로 여겨졌다는 점도 재미있다. 70년대에 첫 등장한 여성용 화장품 세트는 3300?5000원에 판매됐다. 지금 당시와 같은 세트로 구성한다면 족히 30만?50만원이 넘는다.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화장품 가격은 무려 100배나 부풀려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조차 당시엔 상당히 비싼 값이었다. 당시 희귀 품목이었던 금성 BF1006라디오가 7700원에 팔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미(美)는 사치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추억의 흑백TV도 당시에는 어엿한 대접을 받았다.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여로’를 등에 업고 12인치 TV가 6만5700원에 팔리기도 했다. 추억의 빨간 순모 내의는 70년대를 흐르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수영복을 입은 미모의 여배우 살결이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다. 바캉스전이 전단 테마로 처음 등장할 정도로 우리네 살림살이도 펴지기 시작했다. 바나나도 처음으로 염가로 판매됐다. 필리핀산 수입 바나나 염가판매가 식품 바캉스전의 가장 큰 행사로 등장했을 정도이다. 개인용 컴퓨터 종합판매가 처음으로 백화점 전단에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
80년대엔 삼계탕용 닭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백화점 전단에 실린 삼계탕용 닭의 가격은 3200원. 현재와 비교해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기획상품으로 나온 남성 와이셔츠나 여성 블라우스가 3000원대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시 닭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백화점 경품으로 자동차도 본격 등장했다.
명절 선물을 보면 80년 전후로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가 실감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 카탈로그를 점령했던 설탕, 국산 양주 같은 것들은 80년대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 대신 현재와 마찬가지로 갈비가 카탈로그 첫 장을 장식했으며 도미와 전복, 과일세트, 한과, 꿀, 생활용품 세트 등이 뒤따랐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우리 생활상이 글로벌화되는 단면도 엿볼 수 있다. 패션 명품이 추석 명절 선물로 등장하고, 백화점이 직수입한 1000여종의 프랑스 정통와인 행사도 열렸다. 화폐 단위도 몰라보게 바뀌었다. 백화점 사은행사 최소 단위가 1만원으로 높아졌다.
▶1990년대
외환위기는 90년대 한국사회를 반토막 냈다. IMF라는 큰 강은 전과 후를 확연히 구분 지었다. IMF 직전만 해도 백화점엔 해외여행권도 모자라 심지어 콘도회원권까지 경품으로 나왔다. 백화점 전단에서 해외문물전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해외문물전이 열리면 언제든 구름 떼같이 사람들이 몰렸다.
골프와 스키 관련 용품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때부터. 코냑과 로열살루트 21년산 등 고급 위스키도 얼굴을 내밀었다. 심지어 130만원을 호가하는 레미마틴 루이14세 양주와 100만원을 웃도는 영광굴비 등 호화 선물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IMF 이후에는 훨씬 팍팍해진 삶의 무게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집값 폭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아파트가 경품으로 나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엔 난데없는 모델하우스가 설치됐고, 경품으로 분양가 1억원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신세계 특종! 아파트 한 채의 행운이 보입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 아래 분양가만 1억3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았다.
▶2000년대?현재
삶의 질이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술과 문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상품과 가격을 나열해 놓았던 전단도 없어졌다. 경품행사도 2003년을 전후로 슬그머니 꽁지를 내리고 전단에서 빠졌다. 수입차 경품도 이제는 아예 없어졌다.
현재 최고액수를 자랑하는 경품은 고작 해외여행상품권.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도 심심찮게 경품으로 등장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엔 역부족이다.
전단의 얼굴 역할을 하던 여성 배우들도 자취를 감췄다. 81년 김영란을 시작으로 김창숙(82년), 전인화(96.98년), 고소영(99년), 김혜수(2000년), 손태영(2001년) 등 인기 여배우 대신 예술적인 일러스트나 메시지를 넣은 사진들이 전면을 꿰차고 앉았다.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백화점의 추억 한쪽을 부여잡으면 어떤 사회상이 나올까. 아마도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곳곳에 많은 삶의 희로애락이 덧칠돼 있을 것이다. 5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자.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m.com)
<자료제공; 신세계 한국상업사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