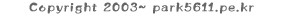법정스님의 글 - 법정스님께서 남기신 글을 올립니다.
글 수 293
| 도서명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
연일 바람이 분다. 까슬까슬한 바람이 살갗을 뚫고 뼛속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다. 3월에 들어서면서 불기 시작한 이 바람은 4월이 다 가야 수그러든다고 이 고장 사람들은 말한다.
산자락을 굽이굽이 휘감아 불어오는 남도의 부드러운 그런 봄바람이 아니라, 아직도 응달에 남아 있는 눈과 골짝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훑어서 휘몰아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결이 거칠고 서슬이 서 있다. 그리고 갑자기 허공에서 골짜기로 내리꽂히듯 불어오기 때문에 그 향방을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날 군불을 지피게 되면 아주 애를 먹는다. 불이 들이다가도 갑자기 아궁이 밖으로 연기와 불꽃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연기와 불꽃에 봉변을 당한다. 풍토(風土), 즉 바람과 흙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레 생각하게 한다.
이런 미친바람 속에서 살다 보면 성질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군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서, 성미가 너그럽지 못한 나는 불이 낼 때 바람을 보고 욕지거리를 마구 쏟아 놓을 때가 있다. 곁에서 들을 사람이 없으니 마음 놓고 퍼부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씨가 거칠어지고 성격이 더 급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도 군불을 지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해보다가 불쏘시개만 태우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해가 기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해가 기울고 나면 바람이 자는 수도 있으니까.
남불(南佛)의 아를에 갔을 때 론 강 유역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었다. 북쪽 들녘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그 고장에서는 '미스트랄'이라고 부른다. 역에서 멀지 않은 호텔 '반 고흐'의 한 객실에 여장을 풀고 밖에 나갔더니 미스트랄이 내 옷깃을 헤치며 파고들었다. 나는 혼자말로 '미친바람이 부네'라고 중얼거렸다.
이 미친바람이 우리 반 고흐를 미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스카니의 가곡 '아를르의 여인' 중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미친바람 속에서는 오렌지 향기고 귤 향기고 움틀 수가 없겠다. 미친바람이 멈추어야만 과수원에서도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내뿜을 것이다.
아를에서 버스로 10여 분 가면 퐁비에이라는 시골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밋밋한 언덕길을 걸어 한참 올라가면 언덕 위에 작은 풍찻집이 하나 있다. 바람이 많은 고장이라 풍차방앗간이 생겼을 법하다. 이곳이 우리 기억에 익숙한 알퐁스 도데의 풍찻간이다. 도데가 1860년 경 <풍차방앗간의 소식>의 연작을 썼던 무대가 바로 이곳이다. 바람 때문인지 아를은 일몰이 아름답고 달빛도 한결 투명했다.
봄이 되니 입이 짧아진다. 어제는 군불을 지피다 말고 모처럼 멀리 장을 보러 갔었다. 가는 길에 동해안의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내 호흡기에는 솔바람과 바닷바람이 알맞게 섞여 있을 것이다. 산골짝에만 묻혀서 지내다보면 좀 뻑뻑해지는데, 바닷가에 나가면 푸른 물결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한다.
산과 바다는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쪽에 치우친 삶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 같다. 산의 고요와 침묵은 인간에게 명상의 씨를 뿌려주고, 바다의 드넓음과 출렁거림은 꿈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우리 삶에는 산만 있고 바다가 없어서는 안 되고, 또한 바다만 있고 산이 없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이룰 수 없다. 부성적인 산과 모성적인 바다의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생동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강릉에는 두루 갖추어진 중앙시장이 있다. 내게는 시장 안쪽보다는 그 언저리 길거리 쪽이 편리하고 또한 장보는 즐거움이 있다. 길거리에는 살아 있는 싱싱한 푸성귀들이 널려 있다. 저울로 달아 이미 포장해 놓고 가격을 매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푸성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훈훈한 인정이 오고갈 수 있어 장보는 즐거움이 따른다.
가까운 시골에서 손수 길러서 가지고 나온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푸근해진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우리 한국인이 본래 모습 앞에 마주서는 것 같아 반갑고 뿌듯하고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화장기 없는 까칠하고 주름진 얼굴과 일에 닳아 거칠고 투박한 손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요 손임을 이런 장바닥에 나와 재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 깊숙이에 자기 어머니의 얼굴과 품과 손결을 지니고 있다. 세상살이에 뒤얽혀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도, 자신의 삶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삶의 뿌리를 의식하면서 그 얼굴과 품을 떠올린다.
명절 연휴 때마다 그 교통지옥을 뚫고 결사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거기 어머니의 얼굴과 품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경우라도, 자신의 고향 생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영상이 고이 간직되어 있다 어머니는 우리 목숨의 뿌리이기 때문에. 가지에는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
장바닥에는 싱그러운 봄나물이 많이 나와 있었다. 돌미나리, 쑥, 냉이, 머위 속잎 그리고 바다에서 뜯어 돈 쇠미역(구멍이 숭숭 뚫린 물미역)을 천원어치씩 샀다. 푸성귀는 무엇이나 한 무더기에 천 원씩이었다. 살 때마다 덤으로 한 주먹씩 더 얹어 주었다. 이것이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후덕한 우리들의 사고파는 모습이다.
수행자는 물건을 흥정하거나 그 값을 깎지 말라는 규율이 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 장으로 푸성귀를 사러갈 때마다 내게는 부끄러운 자책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해인사 시절인데, 저녁공양 시간이 가까워지면 뱃속이 출출해서 할 일 없이 후원을 기웃거리는 일이 더러 있었다.
20리 밖 산 너머에 사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산나물을 뜯어다가 절로 이고 와 파는 일이 봄철마다 있는데, 그날도 후원에 갔더니 절 후원 살림을 주관하는 원주스님이 한 아주머니와 산나물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니 서로가 흥정이 잘 안되어 원주스님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때 내가 아주머니에게 얼마에 팔고 가지 그러세요 하고 끼어들었더니, 그 아주머니는 한참을 헤아리다가 값이 너무 헐하지만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 값을 받고 산나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 얼굴 표정과 집에서 젖먹이 아이가 기다리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서 산을 넘어 가야 한다는 말이 나를 몹시 자책하게 만들었다. 좀 더 나은 값으로 팔게 하지 못했던 일이 그 후 며칠 동안 나를 몹시 괴롭혔다.
헐한 값이지만 그나마 팔지 않으면 그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다시 이고 20리 산길을 넘어야 하고, 집에서는 어린 것이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칭얼거릴 걸 생각하고 서둘러 뒤돌아서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 겹쳐서 연상되곤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 여건 아래서 엎친 데 덮치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마구 밀려드는 현실이니,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늘어갈 것이다.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푸성귀를 사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다 팔아보았자 만원어치도 채 안 되는 채소를 펼쳐놓고 팔리기를 기다리며 해가 기울도록 앉아 있는 모습 앞을 차마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주는 마음이나 내다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 쓰려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이 땅의 우리 마음이다. 어떤 세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따듯해야 이 땅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마음을 우리 땅을 가꾸듯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
산자락을 굽이굽이 휘감아 불어오는 남도의 부드러운 그런 봄바람이 아니라, 아직도 응달에 남아 있는 눈과 골짝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훑어서 휘몰아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결이 거칠고 서슬이 서 있다. 그리고 갑자기 허공에서 골짜기로 내리꽂히듯 불어오기 때문에 그 향방을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날 군불을 지피게 되면 아주 애를 먹는다. 불이 들이다가도 갑자기 아궁이 밖으로 연기와 불꽃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연기와 불꽃에 봉변을 당한다. 풍토(風土), 즉 바람과 흙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레 생각하게 한다.
이런 미친바람 속에서 살다 보면 성질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군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서, 성미가 너그럽지 못한 나는 불이 낼 때 바람을 보고 욕지거리를 마구 쏟아 놓을 때가 있다. 곁에서 들을 사람이 없으니 마음 놓고 퍼부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씨가 거칠어지고 성격이 더 급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도 군불을 지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해보다가 불쏘시개만 태우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해가 기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해가 기울고 나면 바람이 자는 수도 있으니까.
남불(南佛)의 아를에 갔을 때 론 강 유역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었다. 북쪽 들녘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그 고장에서는 '미스트랄'이라고 부른다. 역에서 멀지 않은 호텔 '반 고흐'의 한 객실에 여장을 풀고 밖에 나갔더니 미스트랄이 내 옷깃을 헤치며 파고들었다. 나는 혼자말로 '미친바람이 부네'라고 중얼거렸다.
이 미친바람이 우리 반 고흐를 미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스카니의 가곡 '아를르의 여인' 중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미친바람 속에서는 오렌지 향기고 귤 향기고 움틀 수가 없겠다. 미친바람이 멈추어야만 과수원에서도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내뿜을 것이다.
아를에서 버스로 10여 분 가면 퐁비에이라는 시골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밋밋한 언덕길을 걸어 한참 올라가면 언덕 위에 작은 풍찻집이 하나 있다. 바람이 많은 고장이라 풍차방앗간이 생겼을 법하다. 이곳이 우리 기억에 익숙한 알퐁스 도데의 풍찻간이다. 도데가 1860년 경 <풍차방앗간의 소식>의 연작을 썼던 무대가 바로 이곳이다. 바람 때문인지 아를은 일몰이 아름답고 달빛도 한결 투명했다.
봄이 되니 입이 짧아진다. 어제는 군불을 지피다 말고 모처럼 멀리 장을 보러 갔었다. 가는 길에 동해안의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내 호흡기에는 솔바람과 바닷바람이 알맞게 섞여 있을 것이다. 산골짝에만 묻혀서 지내다보면 좀 뻑뻑해지는데, 바닷가에 나가면 푸른 물결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한다.
산과 바다는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쪽에 치우친 삶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 같다. 산의 고요와 침묵은 인간에게 명상의 씨를 뿌려주고, 바다의 드넓음과 출렁거림은 꿈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우리 삶에는 산만 있고 바다가 없어서는 안 되고, 또한 바다만 있고 산이 없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이룰 수 없다. 부성적인 산과 모성적인 바다의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생동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강릉에는 두루 갖추어진 중앙시장이 있다. 내게는 시장 안쪽보다는 그 언저리 길거리 쪽이 편리하고 또한 장보는 즐거움이 있다. 길거리에는 살아 있는 싱싱한 푸성귀들이 널려 있다. 저울로 달아 이미 포장해 놓고 가격을 매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푸성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훈훈한 인정이 오고갈 수 있어 장보는 즐거움이 따른다.
가까운 시골에서 손수 길러서 가지고 나온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푸근해진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우리 한국인이 본래 모습 앞에 마주서는 것 같아 반갑고 뿌듯하고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화장기 없는 까칠하고 주름진 얼굴과 일에 닳아 거칠고 투박한 손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요 손임을 이런 장바닥에 나와 재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 깊숙이에 자기 어머니의 얼굴과 품과 손결을 지니고 있다. 세상살이에 뒤얽혀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도, 자신의 삶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삶의 뿌리를 의식하면서 그 얼굴과 품을 떠올린다.
명절 연휴 때마다 그 교통지옥을 뚫고 결사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거기 어머니의 얼굴과 품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경우라도, 자신의 고향 생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영상이 고이 간직되어 있다 어머니는 우리 목숨의 뿌리이기 때문에. 가지에는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
장바닥에는 싱그러운 봄나물이 많이 나와 있었다. 돌미나리, 쑥, 냉이, 머위 속잎 그리고 바다에서 뜯어 돈 쇠미역(구멍이 숭숭 뚫린 물미역)을 천원어치씩 샀다. 푸성귀는 무엇이나 한 무더기에 천 원씩이었다. 살 때마다 덤으로 한 주먹씩 더 얹어 주었다. 이것이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후덕한 우리들의 사고파는 모습이다.
수행자는 물건을 흥정하거나 그 값을 깎지 말라는 규율이 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 장으로 푸성귀를 사러갈 때마다 내게는 부끄러운 자책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해인사 시절인데, 저녁공양 시간이 가까워지면 뱃속이 출출해서 할 일 없이 후원을 기웃거리는 일이 더러 있었다.
20리 밖 산 너머에 사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산나물을 뜯어다가 절로 이고 와 파는 일이 봄철마다 있는데, 그날도 후원에 갔더니 절 후원 살림을 주관하는 원주스님이 한 아주머니와 산나물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니 서로가 흥정이 잘 안되어 원주스님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때 내가 아주머니에게 얼마에 팔고 가지 그러세요 하고 끼어들었더니, 그 아주머니는 한참을 헤아리다가 값이 너무 헐하지만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 값을 받고 산나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 얼굴 표정과 집에서 젖먹이 아이가 기다리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서 산을 넘어 가야 한다는 말이 나를 몹시 자책하게 만들었다. 좀 더 나은 값으로 팔게 하지 못했던 일이 그 후 며칠 동안 나를 몹시 괴롭혔다.
헐한 값이지만 그나마 팔지 않으면 그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다시 이고 20리 산길을 넘어야 하고, 집에서는 어린 것이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칭얼거릴 걸 생각하고 서둘러 뒤돌아서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 겹쳐서 연상되곤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 여건 아래서 엎친 데 덮치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마구 밀려드는 현실이니,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늘어갈 것이다.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푸성귀를 사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다 팔아보았자 만원어치도 채 안 되는 채소를 펼쳐놓고 팔리기를 기다리며 해가 기울도록 앉아 있는 모습 앞을 차마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주는 마음이나 내다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 쓰려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이 땅의 우리 마음이다. 어떤 세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따듯해야 이 땅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마음을 우리 땅을 가꾸듯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
1994. 5
글출처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법정스님, 샘터)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