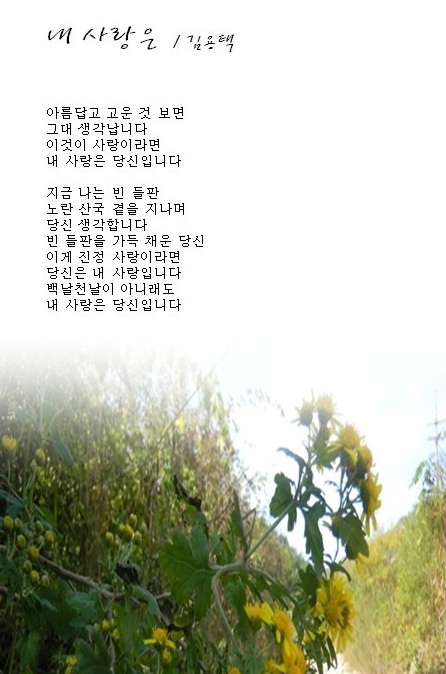마음의 샘터 - 팍팍한 삶, 잠시 쉬어 가는 공간
언젠가 부산의 어느 다도회모임에서 선생님의 시(詩) <그 여자네 집>을 절절한 음성으로 낭송해 주던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마치 그 시 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상기된 표정으로 시 안에 담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주관하는 어느 모임에서 시 읽기를 하는데, 원래는 제 시를 읽기로 한 분이 양해를 구하면서 김용택의 시 한 편을 외우고 싶다더니 분량이 꽤 긴 <그 여자네 집>을 낭송하다 중간에 틀렸답니다. 그랬더니 글쎄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읽는 것이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우리에게 그녀가 눈치 없이 반복해 읽었던 <그 여자네 집>을 저는 이래저래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여자네 집>을 혼자서 찬찬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이런 시를 쓰는 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도 저는 이미 선생님의 충실한 독자였음을 알고 계시지요? 글로만 알고 말로만 듣던 섬진강의 시인이 비로소 우리 수녀원에 나타났을 적에 다른 수녀님들도 모두 반색을 하였지요. 남원에서 산 것이라며 선물로 주신 나무 그릇은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언젠가의 방문길에서는 선물 받은 것이라면 물오징어도 두고 가셨는데 제가 간수를 잘 못해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그대 생각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로 시작되는 이지상 님이 작곡한 김용택의 시 노래에 반해 방송국에 수소문하여 악보를 전해 받은 일도 저에겐 고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섬진강을 지나거나 시골의 초등학교 분교를 지나거나 하면 늘 선생님 생각이 나곤 합니다. 평소에 연락도 자주 못하고 지내지만 앞으로는 종종 전화도 그리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려는데 괜찮을 지요? 부산에 올 일 있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시고 하루 밤 머무시라는 말도 빈말이 아니랍니다. ‘살구꽃이 하얗게 날리는 집’ 그 여자가 백 명도 넘는 우리 집에 오시면 가슴이 뛸지도 몰라요. 수녀원 손님 실에 머무는 탓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각시와 할 수 없이 따로 잘 수밖에 없었다는 불평 섞인 푸념을 바람결에 전해 들었기에 다음에 오시면 침대 두 개를 하나로 모아 붙이고 풍선과 꽃으로 신혼부부 방처럼 멋지게 꾸며 드릴 테니 어서 오기만 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호호호, 상상만 해도 즐겁고 재미있네요.
어느 해 여름 빛바랜 원고지에 다정하게 써 보내신 편지의 한 구절을 읽으려니 제 가슴이 지금도 소녀처럼 뛰는군요.
저뭄을 따라가며
소리 없이 저물어가는 강물을 보아라
풀꽃 한 송이가 쓸쓸히 웃으며
배고픈 마음을 기대오리라
그러면 다정히 내려다보며, 오 너는
눈이 젖어 있구나
방금 제가 좋아하는 시집 《누이야 날이 저문다》 안에 들어 있는 이 시를 읽고 나니 제가 진짜 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탁을 받고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하고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전화하면 걱정을 했더니 껄껄 웃으며 편하게 적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적었는데 맘에 드실지 은근히 걱정입니다. 섬진강의 시인을 세상에 낳아 주신 그 훌륭하신 어머님께도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수녀복 입은 이들을 매우 신기해한다고 하셨지요? 눈이 아름다운 시인의 고운 짝에게도 물론 안부를 전하고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 모두 고마워합니다.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과 동심으로 함께해 온 오랜 세월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사랑받는 시인으로 앞으로도 강물 같은 시들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큰 도시를 선호하는 요즘, 촌에 사는 촌사람임을 스스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늘 존경스럽습니다. 섬진강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김용택이라는 시인을 큰 소리로 칭찬해 줄 거예요.
어느 날 섬진강의 시인이 사는 그 정겹고 아름다운 마을에 제가 불쑥 찾아가 포근하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용택아, 밥 먹었니? 지금 나하고 저 노을진 강변을 거닐어 보지 않을래?” 그러면 “오매, 수녀님이 내게 시방 반말해 부렀네, 잉?” 하며 정답고 짠한 표정으로 웃으시겠지요?! 사랑합니다.
글출처 :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해인 산문집, 샘터) 中에서......
그 여자네 집 / 김용택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웁고
바라보면 정다운 집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깜빡깜빡 살아 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수를 놓으며 앉아 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오는 집
살구꽃이 피는 집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 너머까지 날리는 집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물을 길어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 닿고 싶은 집
샛노란 은행잎이 지고 나면
그 여자 아버지와 그 여자
큰 오빠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종일 노랗게 지붕을 잇는 집
노란 초가집 어쩌다가 열린 대문
사이로 그 여자네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여자가 마당을 왔다갔다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와 옷자락이
대문 틈으로 언듯언듯 보이면
그 마당에 들어가 나도 그 일에
참견하고 싶었던 집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저녁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집
뒤안에 감이 붉게 익은 집
참새떼가 지저귀는 집
보리타작 콩타작 도리깨가
지붕위로 보이는 집
눈 오는 집
아침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그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러 가다가
"하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이" 하며
눈이 가득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싱그러운 이마와 검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칫독을 열 때
하얀 눈송이들이 어두운 김칫독 안으로
하얗게 내리는 집
김칫독에 엎드린 그 여자의 등에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함박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 집
밤을 새워, 몇밤을 새워 눈이 내리고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늦은 밤
그 여자의 방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면
발자국을 숨기며 그 여자네 집 마당을 지나
그 여자의 방 앞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머리에,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가만 가만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 가만히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 집
그 여자네 집 어느날인가
그 어느날인가 못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나와 딱
마주쳤을 때 "어머나" 깜짝 놀라며
뚝 멈추어 서서 두 눈을
똥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반가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환하게,
들판에 고봉으로 담아놓은 쌀밥같이 화아안하게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웃던 그 여자
함박꽃 같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꽃
같은 열아홉살까지 살던 집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샅 첫 집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
그 집 앞을 다 지나도록 그 여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
지금은 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
내 마음 속에 지어진 집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
눈내리고, 아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 각. 을. 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