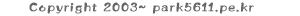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옛 추억의 사진을 올리는 공간
글 수 387
| 해마다 수백 명 목숨 앗아간 '침묵의 저승사자'

연탄은 화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온돌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어 대표적 가정 연료가 됐다. 장작으로 밥 짓고 불 때던 주부들에게 "부엌에서 온종일 물이 끓고 필요할 때면 언제나 불을 쓸 수 있는 연탄 아궁이는 나일론 양말 못지않은 복음이었다." (박완서, '50년대 서울거리')  그러나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사망'이라는 신문기사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었다. "셋집이었는데 구들장에 금이 가 있었던 것 같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확인도 않고 연탄불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난 고압산소통 안에 누워 있었다. 아침에 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긴 안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아내와 아이는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했다." (하성란, '삿뽀로 여인숙') 화가 김병종(서울대 미대 교수)은 1989년 겨울 화실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몇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긴 뒤 건강을 되찾고 '생명'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기 시작했다. 1968년생 소설가 김영하는 10살 무렵 연탄가스 중독을 겪은 뒤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유년 시절에 관한 일이나 향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탄가스가 화가와 소설가의 작품 세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 셈이라 할까. 보사부에 설치됐던 연탄가스중독방지 중앙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피해상황은 1974년 468명, 75년 517명, 76년 1013명 사망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공동연구팀의 1975년 집계에 따르면 1974년 서울에서만 19만8000명이 중독됐고 그 중 850명이 사망했다. 응급 체계 미비로 고압산소통이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잦았고 김칫국물이나 동치미 국물 마시는 게 민간응급조치였다. 아직도 28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가구다. 글 : 김동식·문학평론가(인하대 교수) | 일러스트레이션 : 박광수  출처 : 조선일보 200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