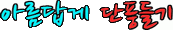만다라(1981년) / 임권택 감독, 전무송, 아성기, 방희,윤양하
감독(Director) : 임권택(Im Kwon-taek)
출연 : 전무송(지산),안성기(법운),방희,기정수,윤양하,임옥경,박정자,박암,최성관,김우빈,이정애,나정옥,성명순,정지희,국정숙,이장미,나갑성,오중근,강유일
줄거리 :
3개월의 동안거(冬安居) 기간, 버스 한 대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서고 군인의 검문이 시작된다. 승려증이 없는 스님이 끌려 내려가자, 젊은 스님도 따라 내린다. 그들은 각각 지산(전무송)과 법운(안성기)이다. 지산은 군인들이 시킨 염불을 하고 풀려난다. 법운은 한 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지산을 다시 만난다. 지산은 부처는 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법운은 6년간의 수행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법운은 다시 길을 떠나는 지산을 따라나선다.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그들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동거에 들어간다. 한 무당의 점안식을 도와준 지산은 내 눈의 점안은 누가 해주냐며 술을 마시고, 가부좌를 틀고 얼어 죽는다. 법운은 지산을 다비하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번민에 찬 얼굴의 불상을 그가 끝내 못 잊어한 옥순(방희)에게 전한다. 법운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박정자)를 만난 후 긴 만행의 길을 떠난다.
영화보기 : https://youtu.be/ztXiqXgMV4s

<만다라>, 길의 미학
한국영화를 상징하는 임권택감독의 긴 필모그라피. 그것은 한국영화 황금기로부터 암흑기를 거쳐 2천년대에 이르기까지 장인에서 작가로 변신하는 자기혁신과정의 필리모그라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편집을 통한 외형적 속도감을 추구하는 양식에서 벗어나 정적 이미지와 여백의 미학 속에 혼돈스러운 현재로부터의 구원을 모색해간다. 또한 그것은 현실적 삶의 본질인 ‘나/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탐색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위치한 <만다라>는 유려한 구도 속에 한국 풍광을 담보하는 이미지가 만개한 걸작이다. ??
<만다라>는 대조적인 캐릭터를 가진 두 승려의 구도행을 다룬 텍스트이다. 자신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화두를 품은채 인생길에서 깨달음(도)을 추구하는 두 승려의 서로 다른 수행과정이 서사를 구성한다. 두 승려는 길에서 만나고, 길에서 헤어지고, 다시 길에서 만나 동행하는 점에서 서사의 핵심은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텍스트는 ‘길의 영화’라고 부를만하다. 실제로 텍스트의 상당 부분은 두 인물이 걸어가는 길, 그 자체를 시적 미장센으로 담아낸다. 영화를 여는 장면에서, 프레임 외부와 내부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반야심경’을 마음의 길로 이어나가는 미장센과 편집이 그 점을 에시한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직역하면, 위대한 (Maha) 지혜의 완성 (Prajna Paramita)을 위한 ’마음의 길‘ (Heart Sutra)이란 뜻이다)
구도행으로서 걷는 길, 그리고 소실점 되기
겨울동안 절에서 칩거하며 수행하는 동안거 풍경으로 열린 화면은 길에서 출발하여 길에서 막을 내린다. 프레임 위쪽에 소실점으로 나타난 버스가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고정된 카메라로 잡은 길이미지는 이후 전개될 두 승려의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만나는 인생길 그 자체를 상징하는 원형이 된다. 그것은 지산이 죽은 후, 법운이 홀로 구도의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그가 길 저편 화면 깊은 곳 멀리 소실점으로 사라지기까지 롱테이크로 잡아내는 마지막 장면과 만난다. 자아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무아의 경지, 즉 깨달음의 길이자 깨달음 그 자체인 길(sutra)의 이미지가 원형구조 속에 시종합일의 경지로 완성되는 셈이다.
시작이자 회귀점인 길가기/구도행 사이에 사계절 자연풍광 속에서도 다양한 길들이 재현된다. 다른 방식의 수행을 해 온 두 승려의 만남과 차이는 같이 걷는 길, 그리고 홀로 걷는 길의 반복 속에서 보여지다가, 결국 앉은 채 동사한 지산의 주검을 지게에 지우고 법운이 걸어가는 길로 연결된다. 특히 흑백필름처럼 모노톤으로 재현된 눈길장면은 이들이 아주 작은 점으로 무화되어 눈 속에 파묻힐 때, 즉 무화될 때까지 관조적 시점의 롱테이크 롱쇼트로 이루어진다. 눈 속에서 앉은 채 동사한 지산의 주검을 앞세우고 길을 가는 법운은 (지산처럼) 눈쌓인 산길 속에서 검은 흔적이 되어 버린다. 이렇듯 자연정취 속에서 혹은 자연스럽게 깔린 길의 이미지들은 프레임 내부와 외부의 거리를 통합시키면서, 프레임 내부에 존재하는 인물들 간의 거리가 주는 긴장을 무화시켜 나간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법운과 지산은 결말부 고적한 암자에서 외부 자연과 자신의 내부를 인드라망 구슬처럼 서로 비추면서 경계 없이 하나로 돌아간다.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길/ 그 길을 따라 피땀으로 헤매었네/ 10년 세월/ 길은 멀어라/ 아침이여/ 돌아보니 /나는 어느새 다시 출발점/ 이 저녁 나타난 부처는/ 백골 같은 허무로/ 나를 술 마시게 하네/ 나를 술 마시게 하네.” 지산이 여자를 안고 읊던 이 시는 그가 깎아낸 피골이 상접한 일그러진 부처상으로 이어지면서 깊은 방황과 허무감을 표상한다. 그것은 구도행의 번뇌를 승화시켜 나가는 처절한 수행과정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 <만다라>를 연출한 임권택의 화두, 모든 게 공하건만 그래도 그 거대한 논리 속에 잠재울 수 없는 살벌한 80년대 초 한국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화두가 여기 얹힌다. 그런 차원에서 <만다라>의 묘미는 바로 이런 아픈 이 땅의 현실과 그것을 관조할 수밖에 없는 선의 미장센으로 길의 미학을 하나로 돌리는데 있다.
글출처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