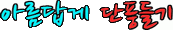별들의 고향(1974년) / 이장호 감독, 안인숙, 신성일, 윤일봉
감독(Director) : 이장호(Lee Jang-Ho)
출연 : 안인숙(경아),신성일(문호),윤일봉(이만준),하용수(영석),백일섭(동혁),전원주(가정부),김미영,정규영
줄거리 :
순진하고 밝기만 했던 경아(안인숙)는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이겨내고 중년 남자 이만준(윤일봉)의 후처가 된다. 그러나 그는 의처증으로 아내를 자살하게 한 과거가 있다. 경아는 낙태한 과거 때문에 그와도 헤어져 술을 가까이하게 되고, 동혁(백일섭)에 의해 호스티스로 전락한다. 화가인 문오(신성일)를 알게 된 경아는 그와 동거를 시작하고, 서로 닮은 점을 보듬으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보낸다. 그러나 동혁이 경아를 찾아오고, 동혁의 협박에 경아는 문오를 떠난다.
심한 알코올 중독과 자학에 빠진 경아의 곁을 동혁마저 떠나고, 문오는 경아를 찾는다. 경아의 집에서 새벽이 되도록 잠든 경아를 지켜보던 문오는 돈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피폐해진 경아를 남겨둔 채 방을 나온다. 술과 남자를 전전하던 경아는 어느 눈 내리는 날, 고향의 어머니를 찾아간다. 경아는 산속에서 수면제를 먹고눈 속에서 잠이 들고, 문오는 죽은 경아의 재를 강에 뿌리며 경아를 떠나보낸다.
영화보기 : https://youtu.be/9cTDLnc3D30
시놉시스

1970년대 최고의 인기 작가였던 최인호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1974)은 한 평범한 여성이 호스티스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멜로드라마적 관습에 입각해서 지극히 통속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랑, 결혼,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여성의 육체와 삶에 각인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영화가 여성이라는 위치와 여성의 성을 애초부터 취약하거나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진 것으로 그려낼 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양면적 현실, 즉 끊임없는 탐구와 매혹의 대상인 동시에 반여성적 폭력과 여성 혐오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순응적이고 희생자적인 여성 이미지는 영화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의 주체성이나 욕망에 대한 ‘희미한’ 기록들과 부분적으로 충돌하면서, 경아의 타락과 죽음을 반복해서 정당화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영화적 장치들은 오히려 여성 관객들에게 통절함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서사적 차원에서 이 영화는 경아가 네 명의 남성들과의 관계 끝에 타살에 가까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회상 구조를 통해서 보여준다. 문호와의 만남과 마지막의 죽음 장면만이 현재 시제를 구성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건과 행위들은 경아의 회상 형식을 통해서 화면에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경아의 역사를 관찰자적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 지는 일들이 이미 과거 시제의 것들이라는 점에서 경아의 비극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이야기 속의 행위 주체인 경아에 대한 관객의 동일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무너지면서, 관객은 전체 이야기의 이면에서 질기게 작용하고 있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야기 구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성차별적 논리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다. 경아의 섹슈얼리티가 짓밟히고 매춘으로 이어지는 여관과 술집은 물론이고, 부자연스러운 붉은 조명으로 표현되는 음악다방과 산부인과는 경아의 육체(처녀성 상실과 중절수술)와 운명(첫사랑의 실연, 결혼의 실패 그리고 자살)에 닥칠 비극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이야기구조와 더불어 영화를 구성하는 주요 기제인 ‘보기(looking)’라는 측면에서 경아는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 영화의 도입부에서, 경아는 윈도우에 걸린 옷들을 홀린 듯이 바라보는데, 곧 이어 마네킹이 입었던 옷들과 가발을 착용하고서 갖가지 포즈를 취하는 경아의 모습이 몽타주로 제시된다. 경아의 환상을 표현하는 이 장면은 경아를 소비자본주의적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영화의 시작부터 그녀의 불행을 그녀의 욕망 탓으로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경아라는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보여 지는 이미지’, 즉 남성들의 관음증이나 물신 주의적 시선의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이러한 의도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우선 이 몽타주 장면은, 결혼에 대한 경아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하는 종이학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장면이라던가, 마지막 죽음 장면에서 경아가 첫사랑 영석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 오는 환영에 빠지는 장면 등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다가 경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기입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여성 주체성의 흔적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멜로드라마 텍스트로서 <별들이 고향>이 지니는 순응성과 저항성 간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경아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하고 또 예고하는데, 반복성과 노골성을 특징으로 삼는 이런 식의 ‘과잉적’ 스타일은 오히려 경아가 가부장제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순진성과 희생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지극히 서정적인 톤의 노래들이 경아의 비극적 모습 위로 반복해서 흐를 때, 우리는 이미지와 음향 간의 극단적인 부조화를 통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작용이 얼마나 가혹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압권은 영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아의 죽음 시퀀스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문호마저 떠난 후 경아가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후의 매춘을 하는 순간까지 모든 음향은 반향 효과로 처리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막다른 절망감에 이른 경아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완전한 타자와 이방인, 즉 마치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경아의 위치를 증후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여기에서 ‘음향적으로’ 준비된 여성 주체성의 지워짐은 눈 위에서의 죽음으로 ‘시각적으로’ 마감된다.
다른 하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경아의 사적 공간과 가족 관계가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시된다는 점이다. 문호와 경아의 마지막 밤은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 지는 경아의 자취방에서 이루어지고, 그날 밤 경아는 비로소 어머니와 고향 이야기를 꺼낸다. 이것은 영화 텍스트가 무의식적으로나마 경아에게 삶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찾아주려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시도였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시골 눈밭에서의 경아의 죽음은 그녀를 어머니와 고향을 상징하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서 한 여성의 실존과 역사는 다시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공간 속에 묻혀버리고 말게 된다.
영화 속에서 모든 남성들의 연인, 남성적 욕망의 수신자였던 경아는 결국 한 줌 재가 되어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짐으로서 가부장제 사회라는 공간과 남성 욕망의 역사 속을 영원히 떠도는 기표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